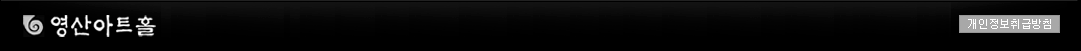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유일한 공연장인 영산아트홀은 올해 다섯 번의 오페라 공연을 올린다. 그런데 좀 이상하다. 오페라 극장이 598석 규모의 소형이라는 것도 이상한데 보통 오페라를 올리는 공연장이라면 무대 앞쪽에 있어야 할 오케스트라 공간도 없다. 더 이상한 것은 지난달 열린 제7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시상식에서 영산아트홀이 예술의전당, 세종문화회관 등 쟁쟁한 후보를 물리치고 공연장 부문 특별상을 받았다는 점이다.
영산아트홀과 영산오페라단을 이끌고 있는 조용찬(65) 단장을 6일 여의도 순복음영산신학원 사무실에서 만나서 ‘왜 이렇게 이상한 게 많은지?’를 물었다.
“엄청난 물량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오페라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보러 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. 그래서 대중이 쉽게 오페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어요.”
해법은 영산아트홀의 활용이었다. 오페라 공연을 올리기 위해 2013년 12월 리뉴얼에 들어갔다. 두려움도 있었다. 공사를 잘못했다간 공연장 내 소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. 1999년 전문 연주홀로 세워진 영산아트홀은 일본 산토리홀, 미국 월트디즈니 콘서트홀 등 세계 유명 공연장의 음향을 담당한 일본 업체 나가타음향이 설계했다.
“오케스트라 공간은 보통 무대 앞에 자리 잡는데 영산아트홀은 크기가 작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. 무대 옆 벽을 허물어 그곳에 오케스트라를 세우기로 했지요.”
오케스트라를 무대 옆에 배치한 만큼 지휘자와 성악가의 시선이 닿는 곳에 모니터를 설치해 서로를 볼 수 있도록 했다. 지난해 5월엔 순복음영산신학원 교수와 학생 16명을 단원으로 영산오페라단도 창단했다. 신학원 교수인 양진모 음악감독이 이끄는 영산오페라단은 창단 두 달 후 ‘피가로의 결혼’과 ‘사랑의 묘약’을 무대에 올렸다. 관객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. 오케스트라가 없으니 무대와 객석 간 거리가 좁혀져 성악가의 소리가 잘 전달됐다는 평가도 들었다
조 단장의 특별한 시도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. 더 많은 공연을 올리기 위해 무대 위에 가로 8m, 세로 4m의 대형 LED 모니터를 설치해 활용하기로 했다. 일반적으로 오페라 공연을 무대에 올리려면 평균 5억∼10억원이 필요하다. 그러나 모니터 속 영상이 무대 장치를 대신하면서 비용 부담을 절반 이하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.
그 덕에 영산오페라단은 올해 다섯 번의 공연을 올릴 수 있게 됐다. 사립 오페라단들이 1년에 한두 차례 공연을 올리는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횟수다. 이달만 베르디의 ‘리골레토’(15∼17일), 모차르트의 ‘코지 판 투테’(22∼24일) 등 두 편의 오페라를 연달아 올린다.
“내년부터는 독일 등 유럽처럼 시즌제로 오페라 공연을 올릴 계획도 세웠어요. 4개월간 오페라 공연만 올리는 것이죠.”
서윤경 기자 y27k@kmib.co.kr

조용찬 영산아트홀·영산오페라단 단장이 6일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수상 소감을 밝혔다. 영산아트홀은 지난달 대한민국오페라대상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제7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시상식에서 공연장 부문 특별상을 받았다. 영산아트홀 제공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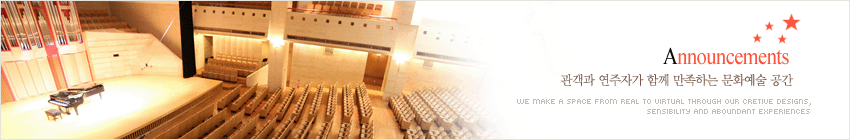
 신고
신고 인쇄
인쇄 스크랩
스크랩







 댓글 0개
| 엮인글 0개
댓글 0개
| 엮인글 0개